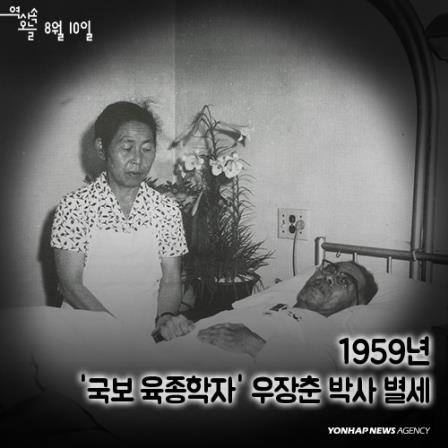
<역사속 오늘> '국보 육종학자' 영예 뒤편에 서린 눈물
(서울=연합뉴스) "벼는 어떻게 되었는가? 수확한 걸 가져오게"
1959년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병상에 누운 60대 학자의 목소리가 간절했다. 중증 십이지장궤양으로 목숨이 위험했지만 이모작 벼 품종의 개발이 더 눈에 밟혔다. 벼 이삭을 고집스럽게 링거병 걸이에 걸어놨던 노학자는 8월10일 눈을 감았다. 그는 '국보(國寶) 육종학자'로 불린 우장춘(1898∼1959) 박사다.
'씨 없는 수박'을 선보인 쾌활한 과학자로 알려진 우 박사. 실제로는 한국과 일본 양쪽에서 배척받은 이방인으로서 그늘진 삶을 살았다. 부친 우범선(1857∼1903)은 골수 친일파였다. 대한제국 군인 출신인 부친은 1895년 명성황후 시해에 가담했고 일본으로 도망간 뒤 현지 여성과 결혼해 우 박사를 낳았다. 그는 우 박사가 만 다섯 살 때인 1903년 조선인 자객에게 피살됐다.
우 박사는 '조센진(조선인)'이라는 핍박을 받으며 히로시마에서 성장, 1916년 도쿄제국대(현 도쿄대) 농학부에 입학해 1936년 모교 농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호적상 이름은 스나가 나가하루(須永長春)였지만 일본에서도 성(姓)은 한국식으로 우씨를 고집해 '우 나가하루'로 살았다. 1950년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귀국해 배추, 무, 감자, 수박 등 작물의 종자 개발을 주도했다. 제주도에 귤 재배를 제안해 '제주 감귤'의 산파 역할을 했다.
우 박사는 고국에서도 외로웠다. 부친이 명성황후 시해 공범이라는 사실이 낙인으로 따라다녔고, 부인이 일본인인데다 자신도 한국어가 서툴러 '사이비 애국자'라는 성토를 들었다. 위안은 연구밖에 없었다. 한국 정부는 우 박사 별세 사흘 전인 1959년 8월7일 그에게 '농학 발전에 큰 업적을 남겼다'며 문화 포장을 수여했다. 애국가 작곡자 안익태(1906∼1965)에 이어 건국 이래 두 번째로 문화 포장을 받는 영예였지만 병원에서 혼수상태였던 우 박사는 그 기쁨을 제대로 만끽하지도 못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