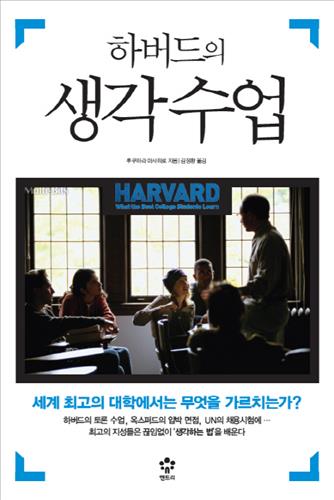
<신간> 생각 수업·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 생각 수업 = 정치, 경제, 사회, 환경,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9명의 저자가 들려주는 인문학 강의.
올해 1월 열렸던 이틀간의 지식 콘퍼런스 '그랜드 마스터 클래스 : 빅 퀘스천'에 참여한 연사들의 강연을 책 속에 담았다.
광고인 박웅현은 '왜는 왜 필요한가'라는 강연에서 현재 우리가 사는 시대는 물음표, 즉 '왜?'라는 질문이 사라졌던 중세시대와 비슷하다면서 인생을 느낌표로 채우려면 반드시 물음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미학자 진중권은 '우리는 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글에서 정치란 상식을 형성해가는 과정이라고 밝히면서 정치가 우리 삶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인지 이야기한다.
경제경영학자 장하성은 '자본주의가 정의로울 수 있는가'에서 현재 한국 경제·사회의 실상을 드러내는 암울한 지표들을 나열하면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지금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로봇과학자 데니스 홍은 '생각은 어떻게 탄생하는가'에서 생각은 전혀 관계없는 두 가지 아이디어를 연결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생각 탄생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설명한다.
알키. 박웅현 진중권 고미숙 장대익 장하성 데니스홍 조한혜정 이명현 안병옥 지음. 316쪽. 1만5천원.
▲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물건 뒤에 감춰진 역사를 살피며 세상을 바꾼 혁신의 기원을 밝힌다. 유리, 냉기, 소리, 청결, 시간, 빛 등이 현대 세계를 만든 6가지 혁신으로 다뤄진다.
저자는 혁신의 탄생을 소위 '롱 줌'(long zoom)의 관점에서 추적한다. 이산화규소가 발견되면서 유리가 발명됐고, 인쇄술의 발명으로 안경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유리 제조에도 혁신적인 변화가 왔다. 안경의 발명은 망원경과 현미경의 발명으로 이어졌고, 망원경의 발명으로 천문학의 발전이 가능했으며, 현미경의 발명으로 세균학이 발전할 수 있었다.
이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혁신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저자는 '벌새효과'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이는 식물이 꿀을 만드는 방식으로 진화하자 그 꿀을 얻기 위해 벌새가 날개 구조를 진화시킨 데서 유래한 용어다. 저자는 아이디어와 혁신의 발전 과정에서도 이처럼 한 분야의 혁신이 다른 분야의 혁신을 끌어낸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프런티어. 스티븐 존슨 지음. 강주헌 옮김. 323쪽. 1만6천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